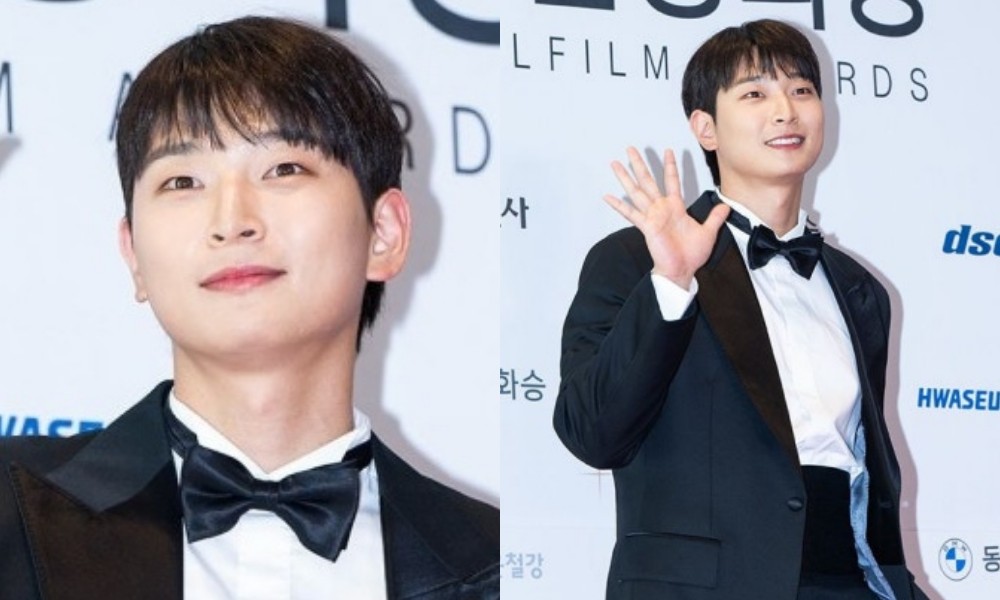도로가 ‘주행 중 충전 패드’가 되는 원리
디트로이트 무선 충전 도로에는 일정 간격으로 유도 코일이 매립돼 있고, 전기차 하부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수신 장치가 달려 있다. 차량이 코일 위를 지날 때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이 차량 수신 코일에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면서 전력이 전달되는 구조다. 말 그대로 “차가 지나가는 순간 도로가 거대한 무선 충전 패드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지금 단계는 ‘기술 가능성’ 검증 수준
이번에 공개된 구간은 수 km가 아니라 수백 m 수준의 짧은 실증 구간으로, 상용 서비스보다는 도시·고속도로에 실제로 깔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험 차량이 도로를 달리며 실제로 배터리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성공해, “주행 중 충전”이라는 개념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했다. 다만 정확한 충전량(시간당 kWh)과 효율, 속도·차량 종류에 따른 편차 등 세부 데이터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된 상태다.

장점: 정차 시간·배터리 용량을 줄일 수 있다
무선 충전 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차량을 멈춰 케이블을 꽂을 필요 없이 움직이는 동안 조금씩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구간(버스 전용 차로, 도심 셔틀 노선, 물류 트럭 전용차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만 이 기술을 적용해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대용량 배터리 없이도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 차량 가격·무게를 줄일 수 있다.
버스·셔틀처럼 같은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차고지에서 오래 충전할 필요가 줄어든다.
급속 충전기 대수를 무한정 늘리지 않아도 피크 시간대 충전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

단점·과제: 비용·내구성·표준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설치 비용: 도로 굴착·코일 매립·전력 설비·제어 시스템까지 더하면, km당 건설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다.
유지보수: 코일·배선이 도로 아래에 묻히는 구조라, 포트홀·재포장·침수 등 도로 손상과 함께 유지보수 난이도·비용이 커질 수 있다.
효율·정렬 문제: 차량과 코일 사이 높이·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실제 교통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더 검증해야 한다.
표준화: 어떤 주파수·출력·코일 규격을 쓸지 국제·국가 표준 합의가 필요하고,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에 맞춰 수신 장치를 통합해야 한다.

어디에 먼저 쓰일까: 승용차보다 ‘노선 차량’ 유력
기술·경제성을 고려할 때, 초기 상용화 대상은 일반 승용 전기차보다는 다음과 같은 노선 기반 차량이 유력하다.
도심 순환 셔틀, 자율주행 셔틀
공항·항만·물류단지 내 화물 전기트럭
고정 노선을 오가는 전기 시내·광역버스
이들 차량은 항상 같은 구간을 반복 주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에만 선택적으로 무선 충전 도로를 설치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대로,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을 한꺼번에 무선 충전화하는 시나리오는 비용·정책·표준 측면에서 당장은 비현실적에 가깝다.

“충전소에 가는 차”에서 “달리며 충전하는 인프라”로
디트로이트 무선 충전 도로 실증은, 전기차를 “충전소에 가서 에너지를 채우는 기계”로 보는 관점을 “도로 인프라와 함께 에너지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시도의 출발점이다. 지금은 수백 m 테스트 구간에 불과하지만, 효율·비용·표준 문제가 해결되면 특정 도시·물류 네트워크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행 중 무선 충전 기술은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충전 방식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는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