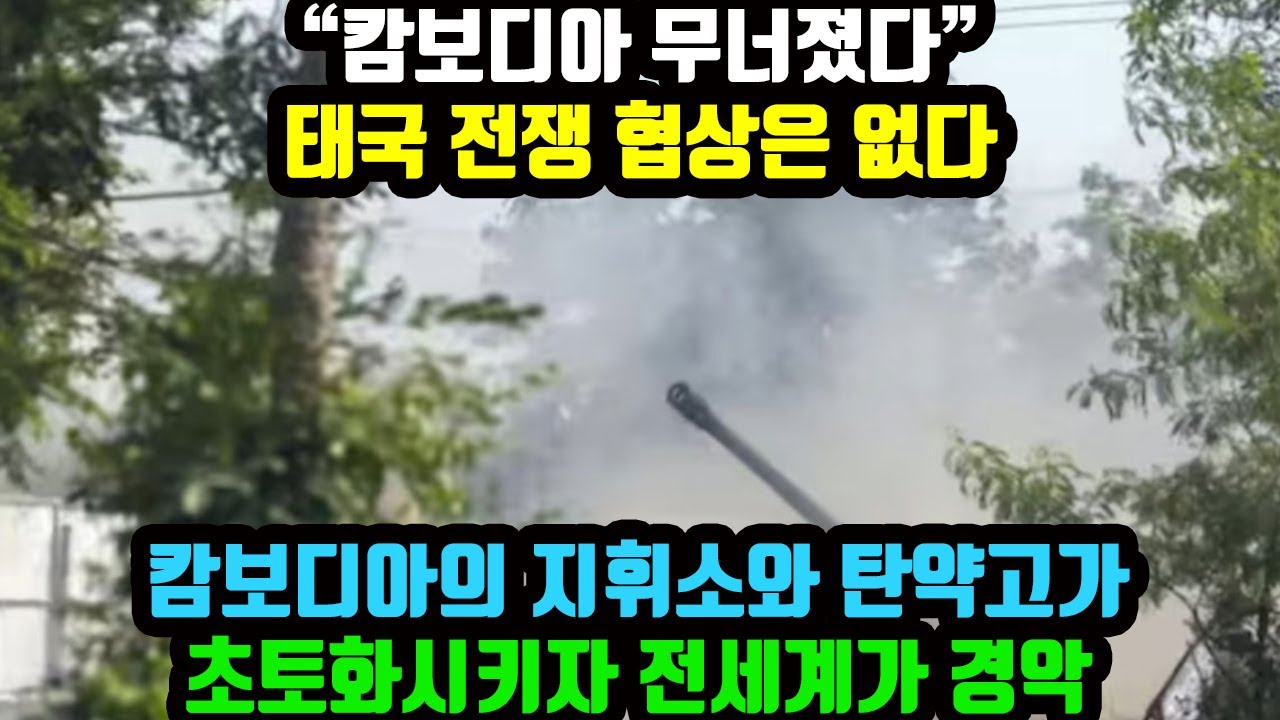교실이 아닌 ‘실습장’에서 배우는 아이들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 지방자치단체·경찰·교통안전협회가 운영하는 교통안전 교육 센터를 찾아 실습형 교육을 받는다. 이 시설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신호등, 골목길 등이 실제 도로처럼 꾸며져 있고, 일부 구간에는 교육용 차량이 직접 주행하며 아이들에게 위험 상황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여기서 보행자 신호 지키기, 좌우 확인, 우회전 차량 주의 등 기본 수칙을 몸으로 익히게 된다.

“차는 이렇게 멈춘다”를 눈으로 보는 수업
특히 일본 교통안전 교육의 핵심은 ‘제동 거리’를 눈으로 확인시키는 데 있다. 아이들 앞에서 저속으로 달리던 교육용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멈추는지 표시해 줘 “차는 바로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각인시킨다. 비가 오거나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졌을 때 멈추는 거리가 얼마나 길어지는지도 시연해, 아이들이 차의 위험성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거리 감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만드는 안전 문화
일본에서는 학교와 교육센터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커뮤니티도 교통안전 교육에 참여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학기 초 통학로 점검, 등·하교 길 어른들의 자원봉사 ‘녹색 아저씨/아주머니’ 활동, PTA 주관 교통안전 교실 등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들 이동 경로를 관리한다. 이런 환경 덕분에 “아이 혼자 알아서 조심해라”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체계적 교육이 만든 낮은 어린이 사고율
일본은 차량 보유대수가 많은 나라임에도, 어린이 보행 중 사망사고율이 선진국 가운데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물론 도로 설계·제도·단속 수준도 큰 역할을 하지만, 어려서부터 체험형 교육으로 ‘차는 무섭다’는 감각을 각인시키는 방식이 안전한 보행 습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단순히 캠페인 몇 번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보고 느끼고 움직이며 배우는 교육이 도로 안전 문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